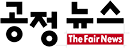미국과 유럽이 ‘인플레이와의 싸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은 세계 경제에 새로운 호재가 분명하다. 지난 2022년 3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 경쟁이 사실상 끝나자 시장의 관심은 언제부터 인하가 시작될 것인가에 집중되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미국연준(FRB)과 함께 금리 인상을 멈춘 것은 독일을 비롯한 역내(域內)의 경기불안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유야 어떻든 미국이나 유럽은 그동안의 급속한 금리 인상에 제동을 걸 시점을 맞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인플레이션 진행 속도도 걱정했던 것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결론을 얻은 것이다,
미국이 선도한 지난 21개월간의 ‘고금리 시대’를 부른 이번 인플레이션은 사실상 코로나 19에서 비롯된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봉쇄 (록다운)의 여파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는 대량의 돈을 풀었다. 코로나 19가 일단 숨을 죽이기 시작하자 살포한 돈이 인플레이션 확산으로 이어지자 돈줄 조이기에 나선 것이다. 전통적으로 정부가 돈줄 조이는 데는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인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미국 FRB가 전례 없는 속도로 기준금리를 연 5.5%까지 인상한 것은 상황이 그만큼 나빴다는 증거다.
유럽중앙은행 역시 기준금리를 4.5%까지 올렸다. 한국은행도 미국의 금리 인상에 보조를 맞추기는 했으나 3.5% 선에서 일단 멈추었다. 미국과의 금리 차 2% 포인트는 원화 가치 방어(환율 방어)와 외자 유출 방지의 미지노선으로 여겨왔다. 따라서 미국 금리 인하가 시작되면 한은 역시 인하에 나설 수밖에 없으나 상황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다.
미국이 내년 언제부터 어느 수준까지 금리를 내릴 것인가에는 정책당국(FRB)과 시장의 견해가 엇갈린다. FRB는 내년 금리 인하가 최대 세 번, 기준금리를 4.6%로 보고 있는 데 반해 시장은 내년 3월부터 시작, 최대 6회에 걸쳐 인하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금리는 FRB의 고유권한임으로 시장의 낙관적 전망이 반드시 설득력이 있는 것은 아니나 적어도 금리 인하의 바탕이 되는 경기와 고용 전망에 대한 ‘낙관적 분석’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FRB가 기대하는 ‘이상적 금리 인하’는 고용이나 경기에 새로운 대책 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황’에서 단행하는 것이다. 미국이 이상적인 금리 인하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할 경우 세계 경제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도 그만큼 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미국 금리 인하 효과를 제대로 수용, 흡수할 수 있느냐에는 문제가 남는다. 미국의 내년 기준금리 목표가 4.6%임을 생각할 때 한국과의 금리 차는 여전하다. 특히 뉴욕 연준이 신용카드 채무 잔액이 1조 7백 90억 달러나 되는, 사상 최고 수준임을 경고하고 있음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층의 연체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카드 이용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어 금리 인하의 연착륙 기대를 흐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 뉴욕 연준의 경고다.
한국이 미국을 좇아 금리인하에 선뜻 나서기를 망설이는 이유 역시 가계부채의 급증과 물가가 제대로 잡히지 않은 데 있다. 3분기 말 현재 가계부채는 1천 8백 76조 원이나 된다. 국제금융협회(IIF)는 한국의 가계부채가 국내총생산(GDP)의 100%를 넘어섰다고 경고하고 있다. 가계부채가 GDP보다 많은 나라는 스위스, 호주,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다. 그러나 다른 세 나라는 자원 부국임을 생각할 때 한국의 가계부채 위험도는 사실상 세계 1위라고 볼 수 있다. 물가 역시 한은이 목표로 하는 2% 선에는 어림도 없는 3% 후반에 머물고 있으며 실업률, 특히 청년층 실업률도 제자리걸음 아니면 뒷걸음치는 형편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금리 인하에 나설 형편이 아니라는 뜻이다.
정책당국은 미국의 금리 인하에 덜뜬 시장을 단속함과 동시에 부동산과 자본시장에서의 투기 현상을 척결할 필요가 있다. 또 면밀한 가계부채 대책도 세워야 한다. 물가가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더욱 오름세를 탈 것이라는 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 [이원두 時事寶鑑]일본, 결단의 용기도 비전 제시도 없었다
- [이원두 時事寶鑑] MZ ‘변협’ ⁃노조, 유스 퀘이크로 이어지나
- [이원두 時事寶鑑] 연금개혁, 프랑스가 부러운 두 가지 이유
- [이원두 時事寶鑑] 삼성반도체 감산 ‘전진을 위한 후퇴’이길
- [이원두 時事寶鑑] 바이든 세계경제 흔들기 종점은 어딘가
- [이원두 時事寶鑑]‘86세대 무오류’가 사법 리스크 불렀다
- [이원두 時事寶鑑] 워싱턴엔 있고 서울엔 없는 ‘여유와 유머’
- [이원두 時事寶鑑]코로나 비상 해제는 경제 복원 시그널이다
- [이원두 時事寶鑑] 변곡점의 민노총, 투쟁보다 반성이 먼저다
- [이원두 時事寶鑑]히로시마. 78년 걸린 한일 정상의 ‘10초 묵념’
- [이원두 時事寶鑑] 미중 협공에 한국반도체 출구 쉽지 않다
- [이원두 時事寶鑑] '재정준칙’ 딴지걸면서 ‘민생’을 말하는가
- [이원두 時事寶鑑] 'KBS 발전방향’이 대통령 직보 사항인가
- [이원두 時事寶鑑] 이재명의 선택, 오염수 장외투쟁 다음은?
- [이원두 時事寶鑑] ‘괴담 정치’는 증오와 몰염치를 먹고 큰다
- [이원두 時事寶鑑]혼돈의 반도체, 칼 뽑은 삼성 충력 지원을
- [이원두 時事寶鑑]‘새마을 금고 위기’, 한고비 넘겼다지만…
- [이원두 時事寶鑑] 오죽하면 한은 총재가 기득권을 성토할까
- [이원두 時事寶鑑] 그렇게 키운 아이, 뭣이 될지 생각해 봤나
- [이원두 時事寶鑑] 경기 바닥쳤다지만 아직도 첩첩산중
- [이원두 時事寶鑑] LH 그냥 두고는 ‘이권 카르텔’ 못 잡는다
- [이원두 時事寶鑑]중국 관광, 이란 자금해제, 성장 탄력 받나?
- [이원두 時事寶鑑] 韓美日 삼각 경제동맹, 시진핑이 자초했다
- [이원두 時事寶鑑] 라임사태가 ‘검수완박’ 빌미도 되었는가
- [이원두 時事寶鑑]국민연금 개혁, 출산률 정상화가 답이다
- [이원두 時事寶鑑] 고유가 속 체감물가 4% 잡을 자신 있나
- [이원두 時事寶鑑] ‘통계왜곡’이 ‘감사조작’이라면 근거 밝히길
- [이원두 時事寶鑑]글로벌 사우스, 세계경제 견인할 수있을까
- [이원두 時事寶鑑] 북 ‘핵 개헌’, 내부 단속용 또는 새로운 배수진
- [이원두 時事寶鑑] ‘新3高’에 움츠린 경제, 하마스 충격까지
- [이원두 時事寶鑑]선관위 이 상태로 총선거 관리 가능할까
- [이원두 時事寶鑑]카카오 위기, 자본시장 후진성도 일조했다
- [이원두 時事寶鑑] 리커창 사망, ‘중국 시장경제’ 막 내렸다
- [이원두 時事寶鑑]악수 않은 ‘협치’… 화이부동, 영원한 숙제인가
- [이원두 時事寶鑑] ‘외날개 파업’ 민노총 노선 재점검할 때다
- [이원두 時事寶鑑] 글로컬 대학, 반세기만의 교육 혁명이다
- [이원두 時事寶鑑] 영국 일본, 감세도 반발하는데 횡재세라니
- [이원두 時事寶鑑]더불어민주당은 왜 ‘탄핵놀이’에 올인하나
- [이원두 時事寶鑑] 등 밀린 노조개혁, 자율 변혁은 언제 쯤일까
- [이원두 時事寶鑑] 간병비 지원, 복지 시스템 강화로 뒷받침을
- [이원두 時事寶鑑]선거와 전쟁 뒤얽힌 지구촌, 북은 ‘남한 평정’
- [이원두 時事寶鑑]‘정쟁 입법 vs 거부권 정치’, 민생 설곳 잃었다
- [이원두 時事寶鑑] 비트코인 상장, ‘디지털 경제대응’ 서둘러야
- [이원두 時事寶鑑] 반도체 초격차 우위, 골든 타임은 더 짧다
- [이원두 時事寶鑑]재해법 ⁃ 택배노조 판결, 기업은 고달프다
- [이원두 時事寶鑑]‘힘들다는 핑계’, 정치는 손흥민에게 배워야
- [이원두 時事寶鑑]‘세계 4위 방위산업, 국가 안보 초석이다
- [이원두 時事寶鑑] 김정은 시진핑 푸틴의 유일한 공통점은…
- [이원두 時事寶鑑] 출산율 감소, 원인 알면서 처방엔 인색하다
- [이원두 時事寶鑑]의사파업이 몰고 온 의료개혁, 뒷걸음 없길
- [이원두 時事寶鑑]중국 이커머스의 무차별 공세 심상치 않다
- [이원두 時事寶鑑]위기의 마트 백화점, 이커머스와 맞서려면
- [이원두 이슈 분석] ‘과천 주택 취소’, 밀어붙이기 시대 끝났다
- 타이완 지진, 세계 반도체 판도도 흔들리나
- [이원두 時事寶鑑] 민주당 총선 대승은 국민에게 갚을 빚이다
- [이원두 時事寶鑑] ‘라인’창업자 네이버 밀어내려는 일본 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