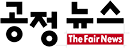‘손주를 지나치게 귀여워하면 할아버지 상투를 잡는다’는 속담은 다분히 교훈적이다. 자손을 귀여워하되 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 지금 우리 사회는 이 교훈이 실종된 탓에 꽃다운 나이의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다른 교사는 학생에게 폭행을 당해 3주 진단을 받은 데다가 트라우마로 출근도 못 한다. 어쩌다가 이렇게 참담한 꼴을 당하게 되었는가?
스승을 임금과 아버지처럼 공경하라는 이른바 ‘군사부일체(君師父一體)’는 최소한의 미덕이었다. 국가 주권이 국민이 아니라 임금에게 있던 시대, 스승을 국가 주권(임금)과 가부장 사회의 핵심(아버지)의 반열에 올려놓고 공경한 것은 ‘내 자식이 사람 노릇 하도록 가르치고 다듬어주기’ 때문이다. 내 자식이 귀엽고 아까워서 그 아이를 가르치는 스승을 높이고 받드는 것이지 그 스승의 학문과 도덕성이 깊고 높아서가 아니다. 그 스승에게 호통을 치고 행패를 부린다면 훈육(訓育)은 설 곳이 없어진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이 나는 것’은 자식 교육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학교, 그것도 초등학교를 찾아가 폭언을 퍼붓고 스스로 잘났다며 벼슬(!)을 자랑하면서 교사를 괴롭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는 아무리 잘해야 그 부모 복사판이 고작이다. 그래서 한 젊은 교사의 죽음 앞에 옷깃을 여미면서 분노하는 것이다.
교육현장이 이처럼 퇴락한 것은 진보 좌파세력에 점령당한 결과다. 전국 교육감 가운데 서울을 비롯하여 대부분이 진보 좌파다. 이들은 교사의 권리, 가르침의 숭고함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로지 어린 학생 인권에만 눈이 먼 사람들이다. 또 교사가 학부모와 학생들의 ‘먹잇감’이 된 것은 2010년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되고 부터다. 이 조례로 인해 배우는 아이들의 인권은 하늘을 찌르는 반면, 가르치는 교사의 권위와 인권은 증발하고 말았다. 초등학교 교사들의 근무환경은 날로 열악해지는 데도 배우는, 철없는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전교조 조합원만 기세가 등등한 것이 현실이다. 어린 학생에게 두들겨 맞고 학부모로부터 입에 담기조차 거북한 욕설을 참고 들어야 하는 현실에서 교육이 제대로 발을 붙이고 뿌리를 내렸다고 하면 누가 믿을 것인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교육부 장관이 앞장을 서서 교육환경, 교사 인권과 교권 보호에 나서고 있으나 오히려 이 틈새를 노려 자기 이익을 추구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집단의 발호부터 막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로 떠오름을 본다. 죽은 교사를 소재로 가짜뉴스를 확산시키는 유력 유튜버, 학생 인권조례로 문제의 씨앗을 키운 교육감과 전교조, 그리고 이들에게 동조하는 학부모가 시치미를 뚝 떼고 ‘교권 강화 운운’하고 나선 것은 위선이 아니라 오히려 코미디다.

실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는 교육감의 애도 글과 ‘끼어드는 전교조’에 대한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고인이 된 교육 동지를 애도하는 것도 좋고 교권 강화도 당면 최대 과제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누적된 악습이 하루아침에 씻겨지는 것은 아니다. 제도를 만들고 운용하는 것 역시 사람의 몫이다. 먼저 사람이 바뀌어야 한다는 뜻이다. 우선 ‘잘났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부터 옷깃을 여며야 한다.
학부모가 학교와 교사를 상대로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내 자식이 끔쪽’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내 자식이 금쪽이라면 남의 자식 역시 금쪽이며 20대 초반 교사 역시 금쪽같은 자식이다. 내 자식만 끔찍하게 여기는 학부모들은 ‘그렇게 키운 자식이 나중에 무엇이 될까’를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성년이 되어 직장인 되었을 때도 직장과 직장 상사를 찾아가서 내 자식 푸대접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것인가? 내가 잘났다면 남도 내만큼 잘났음을 왜 모르는가?
제도 개선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에 제시한 모든 질문에 솔직하게 답을 할 수 있을 때, 또 진솔하게 반성할 때 비로소 교육현장의 부조리가 청산될 것이다. 동시에 스승과 제자가 얽힌 콩가루 집안도 바로 잡힐 것이다. 이념과 진영논리, 극단적인 이기심이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는 날은 언제 올 것인가?.

관련기사
- [이원두 時事寶鑑] 용산시대, ‘대한민국 2기’의 출발점으로
- [이원두 時事寶鑑] 한은 총재 후임은 정쟁 대상 아니다
- [이원두 時事寶鑑] 다주택 중과세, 생계형 치부형 구분해야
- [이원두 時事寶鑑] 윤 정부 1기 경제팀에 거는 기대와 현실
- [이원두 時事寶鑑]코로나 해금, 일상 되찾아도 걱정 남았다
- [이원두 時事寶鑑] 인플레 파이터 자부한 이창용 한은총재
- [이원두 時事寶鑑] 그래도 믿을 것은 반도체 배터리뿐인데…
- [이원두 時事寶鑑] 대선패배 다수당, 새 정부 각료 인선 하나
- [이원두 時事寶鑑] 고통분담 없이는 ’경제위기‘ 극복 못한다
- [이원두 時事寶鑑] 윤 대통령 ‘정경분리 중국외교’ 끝내나
- [이원두 時事寶鑑] 금리 계속 올려도 세금은 내려야 한다
- [이원두 時事寶鑑] 그래도 민주당이 살아나야 한다
- [이원두 時事寶鑑] ‘검찰 중용’ 비판 앞서 ‘깊은 뜻’부터 살펴야
- [이원두 時事寶鑑] ‘금리 허리케인’ 어디까지 버틸수 있나
- [이원두 時事寶鑑] 86세대는 어쩌다 ‘인권보다 민생’인가
- [이원두 時事寶鑑] 절박한 삼성, 3나노로 기술 선두에 서다
- [이원두 時事寶鑑]정치 증발시킨 옹졸한 5060, 경솔한 2030
- [이원두 時事寶鑑]금리 올리면서 돈도 풀어야 하는 현실
- [이원두 時事寶鑑]민주당 ⁃ 민노총, 책임 의식부터 복원을
- [이원두 時事寶鑑]지지율 하락보다 허둥대는 것이 더 문제
- [이원두 時事寶鑑]‘일촉 즉발 대만 해협’ 어디까지 가나
- [이원두 時事寶鑑]이재용 사면, 마지막 ‘정경유착’ 이기를
- [이원두 時事寶鑑]민주당, 1%모자라거나 1%넘치거나
- [이원두 時事寶鑑]‘전기차 보조금’ 올라탄 美 자국우선주의
- [이원두 時事寶鑑]부자 감세 ⁃ 노란봉투, 야당 ‘민생’의 두 얼굴
- [이원두 時事寶鑑] 이재명 기소, ‘정치 타락’에 제동 걸 기회로
- [이원두 時事寶鑑]글로벌리즘 위기, 한국경제 설 자리는?
- [이원두 時事寶鑑]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언제 연착륙 하나
- [이원두 時事寶鑑] '균형 ⁃ 견제' 실종이 국가위기 가중 시킨다
- [이원두 時事寶鑑 ]격동의 반도체, 죽창가로는 대응 못한다
- [이원두 時事寶鑑]‘킹달러 횡포’ 걱정만 하고 있을 때 아니다
- [이원두 時事寶鑑]말 잘하는 이재명 누른 유동규 말 솜씨
- [이원두 時事寶鑑]‘순간적 이성 상실’이 이태원 참사 불렀다
- [이원두 時事寶鑑]이태원 참사, 사법 리스크 빙패삼을 건가
- [이원두 時事寶鑑]윤정부 6개월, ‘정치복원’ 통큰 결단을
- [이원두 時事寶鑑] 빈 살만이 푼 선물 보따리와 일본 패싱
- [이원두 時事寶鑑] 예산안 볼모, ‘보복 입법’에 민생은 산으로
- [이원두 時事寶鑑] 연금⁃건보⁃노동개혁, ‘옹졸 정치’도 청산을
- [이원두 時事寶鑑] ‘대기업이 국가 경쟁력’, 민주당만 모른다
- [이원두 時事寶鑑] '섣달 그믐‘에 뒤통수 맞은 반도체 지원법
- [이원두 時事寶鑑] 윤 정부 2년차, 엇갈리는 기대와 불안
- [이원두 時事寶鑑]무인기 교훈, “안보에도 골든 타임이 있다”
- [이원두 時事寶鑑] 물가에서 경기로… 금리정책 표적 바뀌나
- [이원두 時事寶鑑] 마스크 해금, 정부가 더 분발해야할 까닭
- [이원두 時事寶鑑] ‘검찰 패싱’ 전략 접고 합리적 출구 마련을
- [이원두 時事寶鑑] 서울시장은 ‘지하철 적자 요인 잘못 짚었다
- [이원두 時事寶鑑] 중앙권한 대폭 이양, ‘지방자치 시즌 2’로
- [이원두 時事寶鑑] 회계 불투명 노조에 ‘노랑봉투’ 훈장주나
- [이원두 時事寶鑑] 미의 당근과 채찍에 휘둘리는 한국 반도체
- [이원두 時事寶鑑] 방치된 국민연금 카운트다운 시작됐다
- [이원두 時事寶鑑] 경상수지 최대 적자에도 '방탄'만 급급하나
- [이원두 時事寶鑑]일본, 결단의 용기도 비전 제시도 없었다
- [이원두 時事寶鑑] MZ ‘변협’ ⁃노조, 유스 퀘이크로 이어지나
- [이원두 時事寶鑑] 연금개혁, 프랑스가 부러운 두 가지 이유
- [이원두 時事寶鑑] 삼성반도체 감산 ‘전진을 위한 후퇴’이길
- [이원두 時事寶鑑] 바이든 세계경제 흔들기 종점은 어딘가
- [이원두 時事寶鑑]‘86세대 무오류’가 사법 리스크 불렀다
- [이원두 時事寶鑑] 워싱턴엔 있고 서울엔 없는 ‘여유와 유머’
- [이원두 時事寶鑑]코로나 비상 해제는 경제 복원 시그널이다
- [이원두 時事寶鑑] 변곡점의 민노총, 투쟁보다 반성이 먼저다
- [이원두 時事寶鑑]히로시마. 78년 걸린 한일 정상의 ‘10초 묵념’
- [이원두 時事寶鑑] 미중 협공에 한국반도체 출구 쉽지 않다
- [이원두 時事寶鑑] '재정준칙’ 딴지걸면서 ‘민생’을 말하는가
- [이원두 時事寶鑑] 'KBS 발전방향’이 대통령 직보 사항인가
- [이원두 時事寶鑑] 이재명의 선택, 오염수 장외투쟁 다음은?
- [이원두 時事寶鑑] ‘괴담 정치’는 증오와 몰염치를 먹고 큰다
- [이원두 時事寶鑑]혼돈의 반도체, 칼 뽑은 삼성 충력 지원을
- [이원두 時事寶鑑]‘새마을 금고 위기’, 한고비 넘겼다지만…
- [이원두 時事寶鑑] 오죽하면 한은 총재가 기득권을 성토할까
- [이원두 時事寶鑑] 경기 바닥쳤다지만 아직도 첩첩산중
- [이원두 時事寶鑑] LH 그냥 두고는 ‘이권 카르텔’ 못 잡는다
- [이원두 時事寶鑑]중국 관광, 이란 자금해제, 성장 탄력 받나?
- [이원두 時事寶鑑] 韓美日 삼각 경제동맹, 시진핑이 자초했다
- [이원두 時事寶鑑]국민연금 개혁, 출산률 정상화가 답이다
- [이원두 時事寶鑑] 북 ‘핵 개헌’, 내부 단속용 또는 새로운 배수진
- [이원두 時事寶鑑]선관위 이 상태로 총선거 관리 가능할까
- [이원두 時事寶鑑]카카오 위기, 자본시장 후진성도 일조했다
- [이원두 時事寶鑑] 리커창 사망, ‘중국 시장경제’ 막 내렸다
- [이원두 時事寶鑑]악수 않은 ‘협치’… 화이부동, 영원한 숙제인가
- [이원두 時事寶鑑] 글로컬 대학, 반세기만의 교육 혁명이다
- [이원두 時事寶鑑]더불어민주당은 왜 ‘탄핵놀이’에 올인하나
- [이원두 時事寶鑑] 미⁃유럽 금리인하, 경기⁃고용 살릴 열쇠로
- [이원두 時事寶鑑]선거와 전쟁 뒤얽힌 지구촌, 북은 ‘남한 평정’
- [이원두 時事寶鑑]‘정쟁 입법 vs 거부권 정치’, 민생 설곳 잃었다
- [이원두 時事寶鑑]위기의 마트 백화점, 이커머스와 맞서려면
- [이원두 時事寶鑑] ‘라인’창업자 네이버 밀어내려는 일본 정부
- [이원두 時事寶鑑] 깜짝 성장, 시장 자율에 맡겨두면 실적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