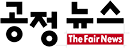국민의힘 당의 전신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최병렬 씨가 타계했다. 최 대표는 나와 약간의 인연이 있다. 고향이 같고 나이도 동갑이다. 같은 신문사 출신이고 직책도 편집부장과 편집국장을 지냈다.
전두환 정부가 탄생한 뒤에 신문사를 떠나 정계로 갔다. 전국구 국회의원 초년병 시절 대화 도중에 “국회의원 생활이 어떻습니까? 할 만 한가요?”했더니 “아이고 정치란 것 말도 마세요. 기자 생활하다가 명색이 정치인이 되어 보니까 갑자기 3류 시민이 된 것 같습니다. 눈치 봐야지 누가 미워하나 살펴야지, 식사를 하려도 맘대로 다닐 수 없지, 자유가 전혀 없어요.”
“하하하, 줄도 잘 서야지요...”
서로 웃으면서 한 말이지만 ‘삼류 시민’이란 말이 오랫동안 가슴에 남았다. 요즘 일부 정치인의 행태를 보면 삼류보다 더 못한 것 같다.
언론인 시절 그의 별명은 ‘최틀러’였다. 히틀러 같은 최병렬이란 뜻이다. 일을 할 때는 기자를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는지 예절에서부터 기사 취재 태도, 특히 기사의 정확도, 진실성을 세세히 따졌다. 아마 최틀러 밑에서 일한 기자라면 요즘 툭하면 터지는 ‘가짜 뉴스’는 어림도 없었을 것이다.
1938년 경남 산청에서 태어난 고인은 부산고,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59년 한국일보 기자로 입사했다. 1963년 조선일보로 편집부 기자로 옮겼다. 취재부서 근무를 희망한 끝에 정치부로 옮겨 정치부 기자로 이름을 알렸다. 정치부장, 사회부장 등을 거쳐 편집국장까지 지냈다.
데스크로 있으면서 후배 기자들을 혹독하게 훈련시켜 ‘최틀러’란 별명을 얻었다. 고인한테 크게 혼난 어느 후배 기자가 “우리가 지금 히틀러 밑에서 일하나”라고 푸념한 뒤 생겨난 닉네임이었다.
고인과 한나라당의 기자출신 정치인인 서청원 전의원과의 인연도 남다르다. 사회 부장 시절 사회부의 이른바 ‘시경 캡’으로 경찰 출입기자들을 지휘했던 서청원 전 의원과 서로 티격태격했던 인연이 2003년 한나라당 대표를 뽑는 경선에서도 경쟁자로 맞붙어 ‘그 악연이 참 질기다’는 말을 듣기도 했다.
고인은 기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정계에서도 활발하게 움직였다. 전 전대통령의 후계자인 노태우(1932∼2021) 당시에는 민정당 중견들과 가까이 지내며 1987년 직선제로 치러진 13대 대선에서 노태우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크게 공을 세워 킹메이커로 불리기도 했다.
노태우 정부에서는 4선 정치인뿐 아니라 공직자로서 전성기를 보냈다. 청와대 정무수석(1988년 2월∼12월), 문화공보부 장관(1988년 12월∼1990년 1월)과 명칭이 바뀐 공보처 장관(1990년 1월∼12월), 노동부 장관(1990년 12월∼1992년 6월)을 차례로 지냈다.
1992년 14대 총선에서 다시 전국구 의원이 된 고인은 이번에는 김영삼 당시 민자당 총재를 차기 대통령 후보로 밀었다. 원래 야당 지도자였던 YS는 1990년 민정·민주·공화 3당 합당으로 여당 대권주자가 되었다. YS가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대통령에 당선되며 고인은 YS정부에서 서울시장(1994∼1995년)을 맡는 등 여전한 관운을 자랑했다.
서울 시장 시절에는 다른 시장들이 숙제로 미뤄놓았던 문제들을 모두 해결하는 결단을 내려 ‘최틀러’의 본색을 잘 발휘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들어 제1야당인 한나라당 대표가 된 고인은 대검 중수부의 불법 대선자금 수사로 당이 초토화하는 위기를 맞았다. 이듬해인 2004년 3월 한나라 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의혹과 측근비리 등을 들어 탄핵소추를 시도해 국회통과를 성사시켰다. 하지만 곧바로 ‘역풍’이 몰아쳐 실패의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에서 물러섰다.
언론인이 정치인으로 변신하여 ‘가짜뉴스’나 양산하는 요즘의 전직 기자와는 판이하게 다른 시대를 만들었던 사람이다.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다시금 그의 ‘불굴의 기자정신’을 기린다.

관련기사
- [이상우 시사칼럼] ‘수석’의 본분은 ‘비서관’이다
- [이상우 시사칼럼] 4차 산업혁명의 성패는 정책 규제 완화에 달렸다
- [이상우 시사칼럼] ‘좀 있다가 알 권리’와 형사 피고인의 인권
- [이상우 시사칼럼] 중국은 아직도 한반도를 동이(東夷)로 얕잡아 보는가
- [이상우 시사칼럼] 비례정당, ‘별종들의 쇼’가 시작 되었다.
- [이상우 시사칼럼] 동서양 ‘마스크 대란’과 문화 차이
- [이상우 시사칼럼] 반려 동물 총선공약, ‘재산’아닌 ‘생명’이란 인식 빠졌다
- [이상우 시사칼럼] 거대정권, 제4부 언론의 역할이 중대하다
- [이상우 시사칼럼] ‘더듬어민주당’ 안 되려면 ‘남녀칠세부동석?’
- [이상우 시사칼럼] ‘40대이하 시청 불가’ 부부의세계가 주는 충격
- [이상우 시사칼럼] 한 척(尺) 나무도 산 위에 오르면 가장 높다
- [이상우 시사칼럼] 원격진료 주저할 이유 있는가
- [이상우 시사칼럼] 미국 대통령 선거 ‘최고령 전쟁’이 될 것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 5개의 다른 유서(언), 누가 진정한 위인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소설 쓰시네요’ 정치인들은 ‘문학’을 모독하지 말라!
- [이상우 시사칼럼] ‘코로나19’ 이후 ‘만사핸통’ 시대 온다
- [이상우 시사칼럼] 코로나와 맞설 것이냐, 백수가 될 것이냐
- [이상우 시사칼럼] 국민 가슴 울린 유행가 가사의 정치력
- [이상우 시사칼럼] 국회는 정치인의 막말 경연장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정부가 원전(原電) 보고 ‘너 죽을래’
- [이상우 시사칼럼] 1백년 역사의 일간 신문이 ‘찌라시’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 불꽃의 ‘신(神)’과 판도라의 ‘신’과 무속의 ‘신’
- [이상우 시사칼럼] ‘흑백 신문’시대의 기자 정신은 어디로 갔나
- [이상우 시사칼럼] 아무리 묘한 정책 있어도 사람 됨됨이가 문제다
- [이상우 시사칼럼] 정치인은 낭만이라는 단어를 알기나 할까
- [이상우 시사칼럼] 원자력 산업 분수령이 된 ‘월성1호기’
- [이상우 시사칼럼] 바이든과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 차이
- [이상우 시사칼럼] 언론의 징벌적 손배, 국격의 후퇴가 우려된다
- [이상우 시사칼럼] 황희 정승과 황희 장관, 닮은 점과 다른 점
- [이상우 시사칼럼] 대법원장은 ‘진실’과 ‘양심’의 국가원수이다
- [이상우 시사칼럼] 탈원전 단체는 소송에서 왜 패 했는가
- [이상우 시사칼럼] 조선 청백리 황희 정승도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 투기...돈 흐름 쫓아가면 투기 잡힌다.
- [이상우 시사칼럼]베트남 제1외국어가 된 ‘한글의 시대정신’
- [이상우 시사칼럼] 악마 퇴치하려다 되려 쫓겨난 드라마
- [이상우 시사칼럼] ‘징벌적 언론개혁’ 계속하겠다는 말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 언론을 죽일 수는 있어도 길들일 수는 없다
- [이상우 시사칼럼] ‘빅4’ 사법처리 앞두고 무슨 검찰개혁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 MZ세대, FIRE 세대 그리고 라떼 세대의 갈등
- [이상우 시사칼럼] ‘탈원전’ 폐기 선언 지금도 늦지 않았다
- [이상우 시사칼럼] ‘비빔밥’과 ‘용광로’의 차이를 인정하자
- [이상우 시사칼럼] 꿩 사냥하던 매가 당하는 수도 있다는데
- [이상우 시사칼럼] 선진국 된 한국, 국민 역할이 중요하다
- [이상우 시사칼럼] 세계는 코로나 넘어 ‘뉴노멀’시대로 가고 있다.
- [이상우 시사칼럼] 여당의 ‘입법공장’이 만들고 있는 언론개혁법
- [이상우 시사칼럼] 모든 증명서를 모바일화 하자
- [이상우 시사칼럼] 대한민국이 조선총독부 법통을 이었단 말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 2021.8.25, 한국 언론에 조종(弔鐘)이 울릴 것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 ‘우민(愚民) 정당’이 되려나 “잘먹고 잘 살아라”
- [이상우 시사칼럼] 더불어 코로나’를 생각할 때다
- [이상우 시사칼럼] 양심을 재는 계산기와 ‘관심경’(觀心鏡)
- [이상우 시사칼럼] 영변 핵시설 재가동과 핵주권
- [이상우 시사칼럼] ‘상 받는 영화와 돈 버는 영화’-이태원의 영화 철학
- [이상우 시사칼럼] 청와대의 잦은 실수, 누구 탓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 ‘말은 생물’ 정치는 말로 승부난다
- [이상우 시사칼럼] 일본은 왜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은가
- [이상우 시사칼럼] K-방역 실패 누구의 책임인가
- [이상우 시사칼럼]일본 사도 섬의 유네스코 등록 막아야한다
- [이상우 시사칼럼]철면피(鐵面皮), 광복회장의 얼굴
- [이상우 시사칼럼]한국의 핵무기 개발 문제
- [이상우 시사칼럼] 권력의 상징 청와대의 내력①
- [이상우 시사칼럼]‘빈손으로 왔다가 옷 한벌 건졌잖아’
- [이상우 시사칼럼]‘도리도리 금지법’도 만드려나
- [이상우 시사칼럼]기막힌 ‘정치 꼼수’, 추리소설 반전 뺨 친다
- [이상우 시사칼럼]국회 법사위서 공연한 코미디 잘 봤습니다
- [이상우 시사칼럼] 기자를 기다리는 대통령
- [이상우 시사칼럼] 새 정부는 탈원전의 주름살 빨리 펴야
- [이상우 시사칼럼] ‘괴물이 된 민주당’ 비판 받는 이유
- [이상우 시사칼럼] 반려동물 배려는 복지정책 차원으로
- [이상우 시사칼럼] ‘판도라’ 뒤집을 영화 ‘신의불꽃’
- [이상우 시사칼럼]절이 싫으면 스님이 떠나야지
- [이상우 시사칼럼] 새 시대 원전은 SMR이 정답이다
- [이상우 시사칼럼] ‘만사핸통’ 모르는 정치인의 망신
- [이상우 시사칼럼]국민의 힘은 국민의 뜻을 모른다
- [이상우 시사칼럼] 고르바초프와 못 이룬 약속
- [이상우 시사칼럼] 尹, 지지율 하락보다 허둥대는 것이 더 문제
- [ 이상우 시사칼럼]끝이 안 보이는 당대표 사법 리스크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93] 로맨스가 넘치는 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