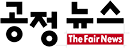아내와 ‘건국전쟁’을 보며 많은 분들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지만 이승만 대통령이 계시지 않았다면, 혹은 초대 대통령이 아니었다면 이 나라와 우리 민족의 운명이 어떻게 되었을까를 생각하며, 국운이라는 것을 실감했습니다.<영웅은 이제 외롭지 않습니다> (오세훈)
두 사람(이승만과 김구) 모두 영웅이면 안 되는 이유라도 있나. 이승만 영화의 희생물로 김일성이 아니라 김구가 되어야 하는 속내가 궁금하다. 영웅 이승만을 위해 꼭 빨갱이가 될 필요는 없다. 이승만도 영웅이고 김구도 영웅이다. (장덕수, 일요서울)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 ‘건국전쟁’을 두고 두 사람의 감상 포인트가 다르다.
두 번째 글은 영화에서 김구의 나레이션을 두고 한 소감 같다.
“내가 북한 지도자 회의에 참석한 동기 중 하나는 북한에서 실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이 앞으로 북한군의 확장을 3년간 중지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그 사이 남한에서 어떤 노력을 한다고 해도 공산군의 수준에 대응할 만한 군대를 건설하기란 불가능하다. 소련인들은 비난을 받지 않고 쉽게 북한군을 남한으로 투입시켜 단 시간 내에 여기서 정부를 수립하고 인민공화국을 선포할 것이다.”(건국전쟁)
1948년 7월 11일 당시 중화민국의 장제스(蔣介石) 총통이 보낸 유어만이라는 사람이 경교장의 김구를 찾아가서 나눈 대화라는 것이다. 김구는 6.25 남침을 예견하고 있었다는 내용이다. 정사로 인정되었는지는 불분명하다.
북한에서 김일성을 만나고 온 뒤 김구는 이승만 정부가 이미 8.15 건국과 조각을 발표한 뒤라 참여 할 기회는 없었다. 김구는 경교장에서 서예로 나날을 보내다가 암살자의 손에 세상을 떠났다.
영화 속 김구의 대화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꼭 그렇게 김구를 뭉개야 이승만이 영웅이 되느냐는 의견이다.
이승만에 관한 영화는 이것이 처음은 아니다. 1959년 자유당 정치깡패로 불리는 임화수가 사장으로 있는 한국예술영화사가 제작하고 신상옥이 감독한 <독립협회와 청년 이승만>이라는 영화가 있다. 반공예술인단에 소속된 김진규, 김승호, 김지미, 엄앵란 등이 출연한 영화다. 곧 있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득표를 위해 자유당과 정부의 지원을 받아 만든 영화였다. 당시 85세로 너무 고령이라는 이미지를 씻기 위해 ‘청년 이승만’을 주제로 하여 갑신정변과 이승만의 미국망명까지만 다룬 영화였다. 여기는 물론 김구가 부각되지 않았다.
1973년에 <광복 20년 아아 김구>라는 영화가 제작되었다. 조긍하가 감독으로, 박암, 신성일, 윤정희가 주연한 영화다. 여기서는 김구와 유어만의 대화 같은 것은 없다.
나도 지난주 아내와 함께 <건국전쟁>을 보았다. 이승만의 공과는 역사가 분명히 밝혀 놓았다. 가장 굵직한 공로는 토지개혁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입을 모은다. 부인할 수 없는 큰 업적이고, 그 두 업적이 대한민국의 밑거름이 된 것은 틀림없다. 과(過)는 부정 선거와 자유당 독재가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영화에서 아쉬운 점은 이승만이 상해 임정을 떠나 미국에서 활약해야만 했던 이유를 설득력 있게 다루지 못했다는 것이다.
일제 강점기 우리 독립운동가의 활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상해 임시정부를 거점으로 독립군을 창설, 일본군과 싸우는 것과 요인을 암살하는 투쟁 방법이었다. 두 번째 방법은 외교를 통한 독립이었다. 이승만은 장제스 정부의 엄호를 받기는 하지만 수백, 수천의 독립군만으로는 7백만이 넘는 세계 3위의 대국 군대를 대상으로 한 무력 투쟁으로는 독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강대국을 설득시켜 외교의 힘으로 독립을 쟁취하는 길이 빠르다고 믿고 미국으로 가서 공부부터 한 것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강대국 손에 달린 한반도의 운명,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의 후원으로 간신히 남한에 자유국가를 세웠다. 이 역할의 중심에 이승만이 있었다.
미국이 6.25 전쟁을 정전으로 밀고 갈 때도 미국을 감쪽같이 속이고 반공포로를 석방한 대담한 행동으로 미국이 한국을 다시 보게 만들어 동맹국이 되었다.
이 부분이 나오기는 했으나 관객의 뇌리에 강력한 인상을 심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관련기사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84] 애국견(犬)의 죽음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86] 키오스크 문맹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87] 정지영 감독의 ‘소년들’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88] 도망자의 최후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89] 꼼수 ‘탄핵 결의 직전 해임’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 생각’ 82] 동물농장엔 ‘암컷’도 설친다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91] 찐찐찐을 생각하자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92 ] ‘공수처 3년’ 한심하다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93] 로맨스가 넘치는 나라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 생각’ 94] 예술과 낙서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95] ‘서울의 봄’ 지포라이터 장군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96] 반려동물이 문화 척도된 이유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97] 정치인의 매력 어디서 나오나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98] 金 명품백 ‘함정’에 빠졌어도 사과는 해야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99] AI가 쓴 소설 가격은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100] 최창조 박사 ‘풍수학’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101] 우리 대통령도 핵가방을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100] ’범죄‘ 피의자 국회되나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103] 연애라도 걸어야
- [이상우의 실록소설 대호(大虎)김종서 66] 범찰의 절반 성공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104] 무엇을 ‘심판’하자는 것인가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105] 장기려, 슈바이처는 어디있는가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신생각’ 106] 수도 옮긴 뉴질랜드
- [소설가 이상우 ‘짧은글, 긴생각' 109] 반려견의 생명 값