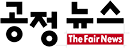의사가 되려면 최대 8년(의학전문대학원. 학부 4년+대학원 4년) 또는 6년(의대. 예과 2년+본과 4년) 교육을 거친 다음 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비로소 자격(일반의사)을 얻는다. 여기에 전공의 과정(인턴 1년, 레지던트 4년)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비로소 그 분야의 권위 있는 전문 의사가 된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짧게는 6년이나 8년(일반의), 길게는 11년 혹은 13년이 지나야 비로소 전문의가 된다. 전문의가 아닌 일반의라도 사회적으로 일정 수준의 존경과 높은 수준의 수입이 보장되는 이유다. 존경과 높은 수준의 수입 보장 배경에는 의료 소비자(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특수성도 큰 몫을 한다. 당연히 그 배경에는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책임감이 따른다. 그런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파업에 나서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언제부턴지 우리나라 의료계는 생명을 다룬다는 경건함과 존엄성을 뒷받침할 사명감과 책임감이 빛을 잃었다. 스스로 고수입의 직업인을 자부하는 것이 현실이다. 아마도 국가 경제 압축성장에 따른 물질만능주의 또는 배금사상이 의료계까지 지배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의료인의 이해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격렬하게 반발한다.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정부 방침에 의과대학생이 단체 휴학계를 낸다고 하거나 전공의가 집단 사퇴 아니면 근무 중단을 위협하는 것은 스스로 의료인으로서의 사명감을 버리고 수입에만 집착한다는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는다.
실제 동맹휴학이나 집단 사퇴로 의료계가 마비된다면 우선 정부로서도 큰일이 아닐 수 없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질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 시대 5대 병원(서울대 병원,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삼성병원, 성모병원)의 전공의는 2천7백 45명이다. 이는 전국 2백 21개 병원의 전공의 1만 3천 명의 21%에 해당한다. 이들이 말 그대로 근무 중단(파업)에 들어가면 우리나라 의료계는 사실상 마비가 된다. 전공의 단체가 ‘우리를 이길 정부는 없다’고 큰소리를 치는 이유다. 실제로 이들은 2000년 이후 세 번에 걸친 파업 또는 파업 위협으로 정부의 무릎을 꿇리고 그들이 노렸던 이익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
첫 번째는 2000년 의약분업을 둘러싼 갈등이다. 김대중 대통령이 의약분업을 강행하자 의료계가 다섯 차례에 걸친 파업 끝에 의대 정원 5백 명 감축이라는 전과를 얻은 뒤에야 승복했다. ‘진단과 치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선진형 분업체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의료계가 반발하고 나선 것은 그때까지 약 처방까지 독점해 온 이권을 값없이 내어놓기 아까웠기 때문일 것이다. 2014년에는 ‘비대면 의료 도입’에 반발 집단 휴진에 들어가 이를 좌절시켰다. 2020년에는 코로나 19 와중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 전공의 80% 이상이 파업에 들어가자 문재인 대통령도 손을 들고 말았다. 이처럼 3전 전승이라는 기록을 가진 전공의들은 이번에도 ‘완승’을 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어찌하랴, ‘기득권을 내려놓으라’ 가 시대적 요구인 것을.
우리나라 의사 연평균 총소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는 통계도 있다. 전체 노동자 평균 소득 대비 2/1~6.8배ᄂᆞ 높다. 지난 2000년 5백 명 줄인 의대 정원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유지되는 동안 의사 연평균소득이 선진국 최고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정부는 이대로 가면 2035년엔 의사 부족이 1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이번에 의대 정원을 늘린 것이다. 이에 반대하여 단체행동에 나서는 것은 스스로 품위를 깎아내리는 데 지나지 않는다. 지방 병원 원장급이나 전문 의사 초빙에 연봉 2~3억 원을 제시해도 오는 사람이 거의 없다. 그 수준의 의료인에게는 2~3억 원이 푼돈에 지나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으면 지나친 것일까? 공급 부족 (의대 정원 동결) 으로 소비자(환자)는 대형병원 예약에 수개월이 걸리는 현실을 의료인은 왜 보지 못하는가.
고대 그리스 의성(醫聖) 히포크라테스 정신을 받들어 만든 제네바 선언을 아직도 기억한다면 의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소비자 생명을 다루는 거룩한 사명감에 충실해야 한다는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