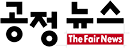이승만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자주 했다. 경무대(지금의 청와대) 제1회의실에서 열린 회견장은 그리 넓지 않았다. 요즘 같은 텔레비전 촬영 세트도 없었고, 기껏해야 사진 기자 몇 명이 무릎을 구부리고 스케치 하는 모습이 보일 정도였다.
이 회견장에서 웃지 못 할 에피소드가 발생했다.
“각하, 회견 시작 하시지요.”
회견장에 나온 대통령은 참석한 기자들을 훑어보았다. 모두가 정장에 근엄한 모습이었다.
대통령이 비서에게 나직이 말했다.
“아직 K기자가 안 왔잖아.”
맨 앞 비어있는 의자를 보며 말했다.
K기자란 당시 신생 신문인 ‘한국일보’ 정치부 소속 경무대 출입 기자를 이르는 말이었다.
곧이어 K기자가 넥타이도 제대로 매지 못하고 허둥지둥 뛰어 들어오며 대통령을 향해 인사를 하고 제자리에 앉았다. 기자회견 때는 항상 K 기자의 자리가 맨 앞에 지정되어 있었다.
대통령이 특정한 한 기자를 기다리는 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이렇게 당시의 정치인은 기자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두려워하기까지 했다.
1950년대의 언론은 사회, 권력으로부터도 지나칠 정도의 특혜를 받았다. 어떤 면에서는 언론의 횡포에 가까운 특혜였다.
우선 신문사를 창설하면 하늘의 별따기 같은 유선 전화 2회선을 주었다. 기자들에게는 기차 1등석을 탈 수 있는 무임승차권 2장을 주었다. 극장에는 기자석이라는 무료 관람석이 제일 좋은 위치에 마련되었다. 인근 군부대에서는 군용 지프차를 취재용으로 그냥 주고, 경찰서에서는 운전면허증과 함께 자동차 넘버를 그냥 내주었다. 야간 통행금지도 ‘보도’(報道)라는 글씨와 함께 붉은 횡선이 그어진 기자증을 보이면 무사통과였다.
아무리 바쁜 고위 공무원이라도 기자가 인터뷰 요청을 하면 거절하지 않았다.
이러한 특혜를 받는 신문기자들은 기사의 진실성을 위해서는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신문사 경영이 어려워 월급을 안주는 달이 더 많았지만 기자는 ‘월급쟁이’가 아닌 진실의 파수꾼이라는 사명감으로 뛰었다.
그런데 요즘의 기자들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 물론 1950년대의 이런 언론문화는 크게 잘못된 것이었지만 요즘과는 너무나 비교가 될 정도로 ‘기자’가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날 구독자 25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 청와대‘ 유튜브에서는 문대통령의 기자회견에 생중계되었다. 조회수 9만 5천회를 돌파한 가운데 기자들이 질문 할 때 마다 ‘언론사 정리가 필요하다‘ ’저걸 기자라고’ ‘기자들이 국민 수준 못 따라 가니까 기레기(기자+쓰레기)’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장시간 회견으로 너무 힘드시겠다.’ ‘언론 개혁은 반드시 완수하여 적폐를 청산하자’는 취지의 글들이 채팅창에 끊임없이 올라왔다(조선일보)
18일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장의 일부 풍경이다. 1950년대 이승만 대통령의 기자회견과는 너무도 다른 풍경이다.
한국의 언론 자유를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았는가.
‘더불어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취지의 기사를 쓴 미국 블룸버그 통신의 기자 실명을 거론한 논평을 낸 것과 관련해 서울외신기자클럽(SFCC)이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는 성명을 냈다.
SFCC는 이날 긴급이사회를 소집한 뒤 "블룸버그 통신 기자 개인을 겨냥한 집권 여당 민주당의 성명에 대해 중대한 우려(grave concern)를 표명 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는 "(문재인)대통령에 관한 블룸버그 기자의 기사에 대한 여당의 대응은 기자 개인의 신변 안전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 된다.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형태로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라며 "SFCC는 각 당의 정치인들에게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존중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중앙일보)
기자는 진실을 보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자신이 쓴 기사가 공정한가를 엄격한 잣대로 검열해야한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그렇지 않다. SNS 시대는 5천만 국민이 모두 보도의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 모두가 기자라고 할 수도 있다.
주로 언론의 감시대상이 되는 권력자가 5천만 기자를 중요하고 두려운 동반자라고 생각 할때 참다운 언론자유의 선진국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