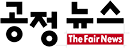담합사건 '늑장처리 논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들의 담합 사실을 확인하고도 행정처분 시한을 넘겨 제재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가 담합사건 처리에 속도를 내지 못한 데 따른 결과라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비상임위원들이 참석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일본 자동차부품 업체인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의 국제 담합사건에 대해 지난달 ‘심의절차종료’ 처분했다. 심의절차종료는 고발·과징금·시정명령 등 제재 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건 심의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공정위 사무처는 두 회사가 2005~2012년 전 세계 시장에서 자동차 제조사들을 상대로 엔진용 점화플러그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2018년 8월 제재 의견으로 전원회의에 상정했다. 두 회사는 입찰에 앞서 각자의 상권(시장)을 나누고, 상권의 낙찰예정자보다 높은 가격을 제시하거나 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현대기아차와 한국지엠 등이 발주한 입찰에서도 이러한 담합이 이뤄졌다.
1심 법원 역할을 하는 공정위 전원회의는 두 회사의 담합을 인정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할 수 없었다. 제재를 내릴 수 있는 처분시한 5년을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다. 당초 사무처는 처분시한 안에 제재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사건을 상정했다. 그러나 지난 2월 대법원에서 “자진신고로 조사가 시작된 사건의 조사개시일(처분시한 시작일)을 ‘신고서 접수일’로 봐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며 상황이 반전됐다. 이에 따르면 덴소가 공정위에 담합을 자진신고한 2012년 5월이 조사개시일이 되므로 처분시한은 2017년 5월 종료된다. 공정위는 내부 규칙에 따라 자진신고서 접수 이후 ‘최초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현장조사에 착수한 날’을 조사개시일로 정하고 처분시한을 넉넉하게 판단했다가 낭패를 본 것이다.
공정위의 담합사건 늑장처리도 원인으로 꼽힌다. 사무처가 자진신고서를 받고 조사를 마무리해 상정하기까지 6년이 넘는 시간이 걸렸다. 2016년부터 내부 규칙상 담합사건은 13개월 안에 조사를 마쳐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제 담합사건은 외국 기업들이 미국·유럽연합(EU) 등 다른 나라 경쟁당국의 조사를 먼저 받고 한국의 조사에 응하려 해 장기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통상 국제담합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하기까지 2년 이상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달리 EU 경쟁당국은 지난해 2월 일본특수도업에 약 3000만유로(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처분시한 문제로 제재하지 못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내부 규칙을 법원 판례에 맞게 개정 중이다. 그러나 덴소와 일본특수도업의 담합사건처럼 기존의 처분시한 기준으로 처리했다가 제재가 어려워지는 사건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그러한 사건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늑장처리’ 지적을 받은 가습기살균제 허위·과장광고 제재 사건에서도 처분시한 문제로 법원에서 잇달아 패소하고 있다. 2011년과 2016년 각각 혐의 없음·심의절차종료 처분을 내리고 2017년 재조사 끝에 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에 과징금을 부과한 사건에서 서울고법은 “처분시한이 지났다”며 모두 업체들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