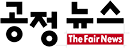일요일이면 교회에 갑니다.
결혼한 이후부터 계속돼 온 일상입니다.
저를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은 아직도 고개를 갸웃 거립니다.
저 작자가 군소리를 하면서도 꾸준히 교회에 나가는 것이 신기하다는 거지요.
소위 믿는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는 겁니다.
제 성향을 잘 아는 후배가 있습니다.
술이 한 잔 들어가면 선배임에도 불구하고 야! 자! 하기 일쑤입니다.
대놓고 이름을 부르면서 힐난합니다.
그만큼 허물없는 사이입니다.
똑바로 살아라! 라고 하는 게 그 친구가 주장하는 요지입니다.
요즘도 가끔 심야에 전화를 합니다.
어김없이 술 취한 목소리입니다.
술 마시고 부담 없이 흰 소리를 할 수 있는 상대로 생각해 주는 겁니다.
고마운 일이지요.
서울에 함께 있었다면 면전에서 할 얘기를 전화로 할 뿐입니다.
언젠가는 “거기서도 교회 다니느냐”고 묻더군요.
물론 왜 그런 소리를 하는지 압니다.
개나 소나 목사 하는 더러운 세상이라는 은유가 깔려 있거든요.
종교 란에 기독교라고 쓰는 입장에서 딱히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것은 일부의 모습이라고 입장을 옹호하기가 너무도 군색합니다.
그 친구도 세상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는 나 아닌 너에게만 도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 몰지각한 사람이 아닙니다.
한심하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종교라는 가면을 쓰고 세상을 기만하지 말라는 기독교계에 대한 충고입니다.
종교라는 울타리 뒤에 숨어 세상을 우롱하지 말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긴 그저 선배가 만만하니까 푸념하면서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그는 신도 축에도 끼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제 깊이를 잘 압니다.
시쳇말로 사이비 신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솔직히 없습니다.
결혼의 조건이라는 처가의 권유를 받아들인 것뿐입니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고 큰 의미를 두지 않았습니다.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매일 일을 핑계로 밖으로만 떠도는 생활에 대한 보상 정도로 여겼습니다.
그래 매일도 아닌데 어떠냐 싶었거든요.
가서 어색한 미소로 교인들과 인사하고 적당히 앉아 있다가 돌아오면 되니까요.
대충 눈치를 보고 졸다보면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이게 뭐냐 싶어 앙탈을 부린 적도 있습니다.
내 의지대로 하겠다고 교회에 가지 않았던 겁니다.
끌려 다닌다는 피해의식이 생겨 꼴통을 부렸습니다.
그러나 모양새가 나지 않더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이 한 몸 접자는 생각에 원상복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변방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저 묻어갈 수 있는 대형교회를 다니려 했습니다.
아내 역시 성향이 비슷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나 마땅하지 않았습니다.
번잡함은 그렇다 치더라도 작위적인 분위기에 그만 질리게 되더군요.
사는 곳 근처의 작은 교회를 다니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을 뛰놀게 하는 마인드가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텃밭도 있고 해서 주변 환경이 꽤 목가적인 것도 좋았습니다.
벌써 2년 전의 일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시간에 목사님이 그러시더군요.
간구하고 기도하라고.
그런데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하지는 말라고.
복은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이라고.
감았던 눈을 떴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대단하게 여겨져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찌 보면 하기 쉽고 흔한 말일 수 있습니다.
눈을 뜨게 만든 것은 바로 진정성이었습니다.
목사님의 간구나 기도가 허언이 아니라는 느낌이 마음과 몸속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 여기 오길 잘했다고 가슴을 쓸어 내렸습니다.
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다고 종교관이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은 물론 아닙니다.
여전히 예배시간에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졸기도 합니다.
그래도 분명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주일을 기다리는 정도는 아니지만 예배시간에 맞춰 자발적으로 나갑니다.
아직도 생경하게 느껴지지만 예배의식에 대한 거부감도 없어졌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설교에 귀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더러 알아들을 수 없는 말씀도 있지만 일일이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간혹 쓸데없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전체적으로 같은 맥락의 얘기를 매번 달리하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준비도 준비겠지만 스트레스일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한번 여쭤본 적도 있습니다.
한없이 행복하다고 하시더군요.
가식 없는 순수하고 진정어린 대답이었습니다.
불현듯 예수의 말씀을 들여다보자는 욕구가 생겼습니다.
메시지만이 아닌 리듬이 가미된 노래로 여겨보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기를 가르는 바람을 스치는 기분으로 말입니다.
교정선교회 운영위원으로 여기저기 간증을 다니는 목사가 있습니다.
고 김근태 상임고문에게 용서받았다고 주장하는 그는 고문을 합리화하고 좌익척결을 외칩니다.
김근태 고문을 사지로 몰았던 이근안이 바로 그입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나라, 배신 없는 나라를 찾다가 하늘나라를 찾았답니다.
그래서 예수쟁이가 됐다고 합니다.
생전에 김근태 고문은 그를 용서하지 못하는 자신을 스스로 옹졸하다고 했답니다.
끝가지 자기성찰에 애쓴 김근태 고문의 인격에 머리가 숙여집니다.
용서는 ‘신의 영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용서 운운하기 이전에 이근안 목사는 예수의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예수의 노래는 권위와 기득권의 편이 아니라 항상 소외된 자들에게 향하고 있습니다.